꽃과 나무들이 매일 달라지는 봄의 소식을 전한다.
그에 반하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
반복은 삶을 단조로운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미디어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안정적인 삶이라 설득한다.
과거의 우리 사회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채찍을 들었다면, 오늘날의 미디어는 현대인을 토닥이며 조련한다. 변화를 위한 실험은 더이상 시도되지 못하고, 미디어는 이를 단순한 흥미거리, 볼거리로 전락시킨다.
현대인은 일상의 특별함이나 일탈마저도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리만족하고, 기껏해야 미디어가 제안하는, 여전히 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적인 형태의 상품으로서의 일탈을 소비한다. 결국 일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디어는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현대인을 길들인다. 이 과정에서 안정되는 것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다. 미디어는 이를 감추고 우리의 일상을 생산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또다시 효율적인 반복이다. 미디어가 일상을 지배한다.

과거에는 자연과 예술이, 낭만적이게도, 이러한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들은 삶을 사유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자극적인 디지털 컨텐츠가 시각현실을 압도하는 오늘날,
봄날의 꽃구경이든 화이트큐브 전시장의 예술작품이든,
그 앞에서 삶에 대해 사유하기란 점차 어려운 일이 되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을 쉽게 지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채운다. 반복된 일상에 개입하고 우리를 사유의 장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아원고택(전북 완주군)에서 진행 중인 도예가 이수종의 전시 또한 이러한 시도 속에 있다. 전시 공간의 백자달항아리와 철화달항아리들은 마치 도예 전시장이 아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지는 무대 위에 놓여 있는 듯 보인다. 전시는 개인전의 형식이지만 동료 예술가들이 미디어 아트로(이이남), 전시공간의 음악으로(OMA Space), 달항아리를 촬영한 한지 사진(양재문)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시 전체에서 달항아리 미학이 총체적으로 제시된다.
항아리들은 공간을 채우는 음악과 함께 회화, 사진, 영상 작업들 가운데에 마치 연극의 등장인물처럼 서있다. 또한 전시 공간의 연출은 관객을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무대의 참여자로 만든다. 무대에서 관객은 자연스럽게 도예가의 미적세계로 진입한다. 무대의 조명 아래에 비어 있는 달항아리가 현실세계의 자극적인 컨텐츠를 대신한다. 관객은 비움의 장소를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응시할 여유를 갖는다.
달항아리에는 한평생 흙을 만져온 도예가의 감각이 응집되어 있었다. 약 60년간 도예작업을 해오면서 빚어온 것은 어쩌면 항아리가 아니라 도예가의 미적 심성과 감각일지도 모른다. 그가 만들고 그린 달항아리와 회화 표면의 단순한 색과 자유로운 표현기법, 항아리 형태의 비정제성은 비기교적이고 자연스러운 미감 속에서 무수한 변화의 감각들을 발산한다. 관객은 오랜 기간 수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업해온 작가의 체화된 조형감각 뿐만 아니라, 창조과정 속 ‘차이’를 세밀하고 집요하게 탐구하며 고집스럽게 세워온 작가의 미적 기준이 만들어내는 울림과 조응한다. 매끄러우면서도 거칠고 고고하면서도 순박한 모순적인 조화는 과부화에 걸린 현대인의 정서를 포용하는 힘이 있다.
전시는 달항아리를 매개로, 흙을 통해 예술가로서 호흡해온 도예가의 삶과 미적형식의 근원인 자연을 연결한다. 이수종의 항아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이 단조롭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차이’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봄이 되면 피어나는 꽃들도, 주기가 돌아오면 차오르는 하늘의 달도, 세월을 담아 빚어낸 항아리도 모두 비움의 과정을 지나 변화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정작 ‘차이’는 변화의 시공간을 인식하는 나의 사유로부터 나와야 한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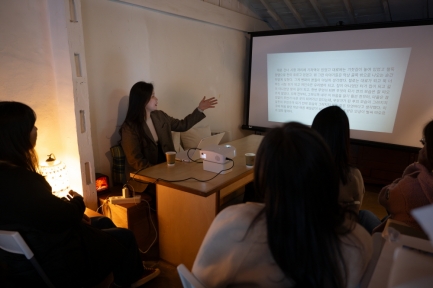



![[소금공방 Sogeum workshop] 네 명의 작업자가 함께하는 창작 공동체 섬네일 파일](../data/upload/thumbnail_20220621164609_13134.jpg)


![[전주-예술-리뷰] 발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섬네일 파일](../data/upload/thumbnail_20220621173626_99306.png)
















